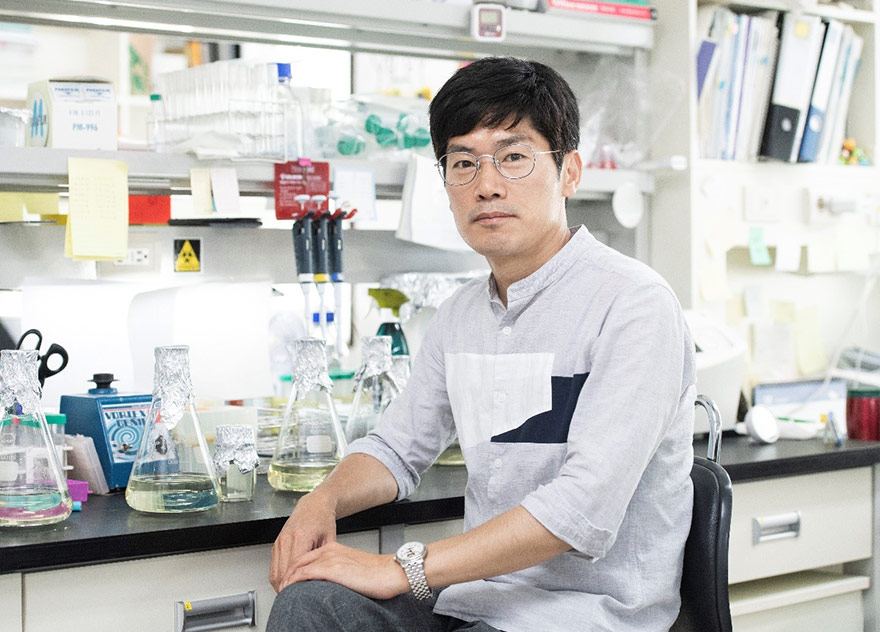
김태수 교수팀 연구 논문, 세계적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게재
생명과학과 김태수 교수팀이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Hda1 복합체의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세포가 영양 결핍 상태에서 어떻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지를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JCI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분야 1.8%, IF 16.7)> 온라인판에 4월 18일(금) 게재됐다.
히스톤은 DNA와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이들의 화학적 변형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히스톤 아세틸화효소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의 균형에 의해 조절된다.
연구팀은 효모 세포를 모델로 해 영양 결핍 상태에서 Hda1 복합체의 작용 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Hda1 복합체가 활발히 전사(유전자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되는 유전자에서는 히스톤 H4를, 비활성 유전자에서는 히스톤 H3를 각각 선택적으로 탈아세틸화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따라 Hda1 복합체가 유전자의 조절 영역으로 이동하며 RNA 합성 효소(RNA Polymerase)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Hda1 복합체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더 나아가 Hda1 복합체가 단순히 RNA 합성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리보솜 관련 유전자들(RNA Pol I, II, III의 전사 대상)을 모두 조절하고, 실제로 단백질 번역(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Hda1 복합체가 결실된 세포는 번역 억제제가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리보솜 구조에도 이상이 나타나는 등 단백질 번역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러한 결과는 Hda1 복합체가 전사와 번역을 연결 짓는 핵심 인자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세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질병 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사와 번역을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인자를 규명한 것으로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태수 교수 | 이민경 박사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김태수 교수(교신저자), 이민경 박사(제1 저자), 이수영 교수(공동저자), 노태영 교수(공동저자) 연구팀은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